♥ 직업에 貴賤은 있다.

직
업에는 분명히 귀천(貴賤)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서점 주인을 귀한 직업의 반열에 두고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사농공상(士農工商) 이란 말은 우리에게 익숙했다.
책을 파는 일은 분명 상업에 해당하지만, 내 어머니가 서점을 글방이라 부르는 것은 ‘선비’ (士)를 의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서점 주인이란 자리를 범상치 않게 보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다.
헌 책방이 줄을 선 청계천6가, 한 아이가 그림동화전집을 사겠다고 떼를 쓰고, 돈이 모자란 엄마는 다음에 사자고 아이를 잡아끈다.
바라보던 서점 주인이 그림동화전집을 끈으로 묶어주고 “통장번호를 적어 주며 돈은 나중에 보내주세요”한다.
“아저씨 제가 책값을 떼어 먹으면 어떡하시려고요”하는 엄마의 말에 “책값 떼어먹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 안 보내 주셔도 할 수 없고요” 한다.
그 말은 선율을 타고 잿빛 도시에 민들레 씨앗으로 퍼진다.
청계천의 부민서림 이부민씨.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팔든, 세상에 얼마만큼의 따뜻함을 내어줄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직업의 귀천을 분류하는 나에게,
그는 서점 주인이란 직업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고대하던 책방주인이 되었다.
내 바람은 나의 “시인학교서점”이 은행동에 행복을 전염시키는 곳이고 싶었다.
커피 한잔 들고 있는 이른 오후(점심이 막지난 시간) 어느 날 이었다.
초등학생 몇 명이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더니 컴퓨터CD가 들어 있는 책이, 한 아이의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냐 나쁜 짓을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물건을 훔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나의 마음이 더 당혹스러웠다.
결국 나는 그 아이를 따로 불러 얘기했다.
훔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과 물건 값은 내일 가져 오라고 했다.
녀석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서점 주인이든 글방 주인이든, 책을 파는 작은 내 공간이 회색빛 도시에 한 포기 들풀이라도 될 수 있는가.
향기로운 서점이고자 했던 것은, 진정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의 장난에 그칠 것인가.
아! 가을이다.
감나무 가지 끝에 몇 개 달린 감이, 푸르러 쓸쓸한 하늘을 배경으로 섰다.
배고픈 시기에도 감 몇 개를 까치밥으로 남겨 놓는 감나무 주인이 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진 후에는 내 직업이 정말 귀해질 수 있을까.
연합기독교방송 특집부장 // 박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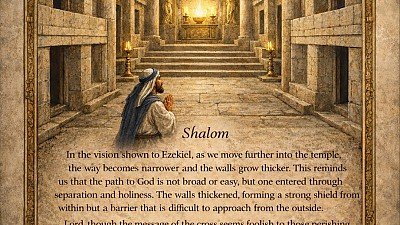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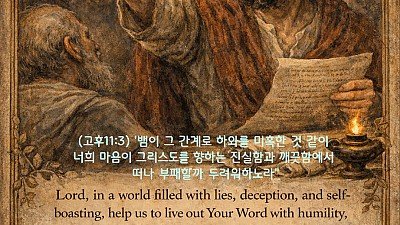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