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과학상 발표

올해 노벨과학상이라고 부르는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의 주인공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벨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강합니다.
노벨과학상과 관련 일본과 중국의 경우 그동안 수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은 아직 '추격형' 모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 ABCD모델이 있습니다.
민첩성(Agility), 벤치마킹(Benchmarking), 융합(Convergence), 헌신(Dedication)을 뜻합니다.
속도와 정확성을 갖춘 민첩성(A),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벤치마킹(B),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지는 융합(C), 이를 통해
조직과 세상에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D)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과학은 1967년 KIST가 설립되고 1968년 과학기술처가 생기면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 역사가 짧다 보니 우리나라 과학 정책은 '따라가기 전략'이었습니다.
앞선 나라의 과학기술을 추격하기 위한 속도와 벤치마킹에만 주력했습니다. 융합과 헌신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과학상을 보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난 2일 노벨생리의학상이 발표됐습니다.
생체시계를 규명한 제프리 홀 브랜다이스대학 교수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생체시계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1984년 제프리 홀 교수가 '피리어드(Period)' 단백질이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밝혀낸 생체시계는 '시차적응' 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있어 생체리듬을 이용해 어떤 주기에 치료하면 최적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일 발표된 노벨물리학상에 라이고(LIGO) 중력파 연구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입니다. 라이너 와이스 MIT, 배리 배리시·킵 손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 등이 공동수상했습니다.
이들은 검출하기 매우 힘들었던 중력파를 찾아냈습니다.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만든 것입니다.
중력파는 그동안 광학, 전파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우주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세상과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우리 인류에게 '헌신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4일 저녁에 발표된 노벨화학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벨화학상을 받은 리처드 헨더슨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1990년 전자현미경을 통해 원자 분해능에서 3D 단백질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랭크(Joachim Frank)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이 기술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노벨화학상과 관련해 "저온전자현미경을 통해 생화학 지도 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BCD 모델을 노벨과학상에 적용해본다면 D(헌신)이란 부분에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벨상은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판 이들에게 돌아가는 영예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전 인류에게 '혜택이 되고' '헌신되는' 곳에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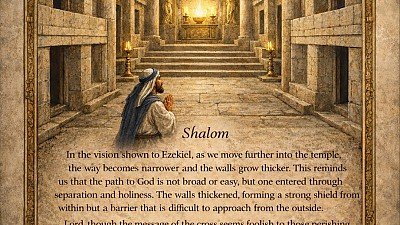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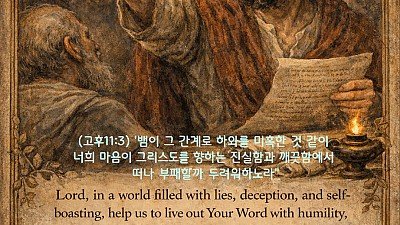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