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21일 국토교통부·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2만9,000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3%(KB국민은행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최대 호황기로 꼽히던 2006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현재와 비슷한 2만2,700건이었고 집값 상승률이 10.9%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하면 확연한 차이다.
거래량 대비 가격의 탄력성이 예전만 못한 셈이다.
문제는 가격 상승 없이 주택 거래량만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과거에는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은행에 거액의 원리금을 내도 '집값이 수천만원 올랐으니 이득'이라며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다. 실제 200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4.6%로 지난해 1.8%의 2배가 넘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의 효과 없이 길게는 30년 동안 수십만원의 원리금만 은행에 내야 할 판이다.
사교육비 증가와 노후대비용 연금 부담 등으로 좁아진 내수 기반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가격 상승 없는 주택 거래량 증가는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 늘려 장기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는 이제 소비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했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마저 짓눌리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는 소비 진작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65%가량이 '변동금리 담보대출'인 상황에서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 대출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를 더 옥죌 수 있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의 영향으로 1년간 민간소비가 1조 원(약 0.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거래량 폭증에도 가격은 요지부동인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인식이 '투자'에서 '거주'로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뇌리에 '부동산 불패신화',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인식이 있었다. 시세보다 높은 집도 무섭게 팔리며 집값이 올랐다.
집을 2~3채씩 사들이는 투기도 성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주택 매수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집을 사지 않고 매도자도 적당한 가격이면 집을 팔아 전체적으로 집값이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이 점점 미뤄지며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며
"고령층도 노후 자금이 부족해 집을 처분하는 추세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3%(KB국민은행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최대 호황기로 꼽히던 2006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현재와 비슷한 2만2,700건이었고 집값 상승률이 10.9%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하면 확연한 차이다.
거래량 대비 가격의 탄력성이 예전만 못한 셈이다.
문제는 가격 상승 없이 주택 거래량만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과거에는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은행에 거액의 원리금을 내도 '집값이 수천만원 올랐으니 이득'이라며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다. 실제 200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4.6%로 지난해 1.8%의 2배가 넘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의 효과 없이 길게는 30년 동안 수십만원의 원리금만 은행에 내야 할 판이다.
사교육비 증가와 노후대비용 연금 부담 등으로 좁아진 내수 기반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가격 상승 없는 주택 거래량 증가는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 늘려 장기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는 이제 소비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했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마저 짓눌리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는 소비 진작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65%가량이 '변동금리 담보대출'인 상황에서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 대출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를 더 옥죌 수 있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의 영향으로 1년간 민간소비가 1조 원(약 0.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거래량 폭증에도 가격은 요지부동인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인식이 '투자'에서 '거주'로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뇌리에 '부동산 불패신화',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인식이 있었다. 시세보다 높은 집도 무섭게 팔리며 집값이 올랐다.
집을 2~3채씩 사들이는 투기도 성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주택 매수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집을 사지 않고 매도자도 적당한 가격이면 집을 팔아 전체적으로 집값이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이 점점 미뤄지며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며
"고령층도 노후 자금이 부족해 집을 처분하는 추세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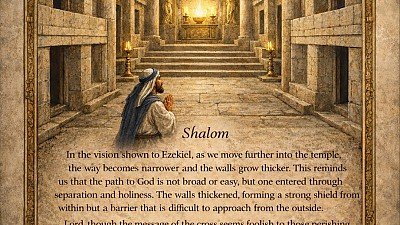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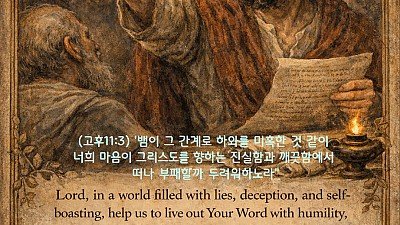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