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국밥의 비밀

낙원동의 터줏대감 ‘소문난 해장국’의 권영희(69) 사장은 신문 지면에 종종 등장했던 ‘단골’이다.
1998년 10월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17년 전 권 사장의 얼굴이 담겨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0평 남짓한 가게를 꾸려가면서 3남매를 뒷바라지하던 시절이다.
처음 가게 일을 거들던 70년대엔 400~500원 받고 밥을 팔았다. 40여년이 흘러 밥값이 2000원이 됐으니, 해마다 40원 정도 가격이 오른 셈이다.
“참 악착같이 했지. 이제는 (장사를)거의 취미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권 사장이 가게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건, 단골손님들에 대한 ‘의리’ 때문이다. 2000원짜리 해장국을 맛있게 비우고 가는 손님들은 하루에도 수백명에 달한다.
그는 “2000원에 팔면 남는 게 있냐면서 손님들이 봉사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도 장사는 장사잖아요”라고 했다.
“내가 가게에 붙어있으니까 그나마 절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스불도 칼같이 끄고, 가게 여기저기 필요없는 전기는 다 끄고 다녀요.
운영을 넘겨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대로 넘기면 이만큼 운영을 못해요.”
비록 2000원 국밥 장사를 하면서도 얼마간의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끼고 또 아끼는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리 아껴도 요즘엔 적자를 피하기 힘들다”고 고개를 저었다. 재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장국의 주된 재료인 우거지의 시세가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한 게 가장 큰 걱정이다.
“5월이면 우거지가 한창 많이 나올 시기인데도 한 다발에 1만5000원씩이나 해요. 작년에 수확한 배추가 적어서 그렇대요. 보통 이 시기엔 5000~6000원이면
사기도 했거든요. 재료 시세가 파동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깍두기도 한통 담그는데 5만원 들 때도 있고 10만원 넘게 쓸 때도 있어요.”
그동안 갖은 오해도 많이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만든다”는 얘기였다.
버리는 소기름을 구해다가 국물 맛을 낸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권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옛날이고 지금이고 우거지를 주워서 한 적은 없어요. 지금은 우거지가 건강식이라는 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예전엔 기본적으로 쌌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배추 껍데기가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만 보고 그렇게들 말해요. 신경도 안 쓰지만….”
종업원 4명은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주말엔 쉰다. 하지만 권 사장은 1년에 단 나흘만 쉰다. 설과 추석 때 이틀씩이다.
1년 365일 가운데 361일이 그로선 ‘영업 중’이다.
“돈 욕심 때문은 아니예요. 더 벌고 싶으면 이 좋은 자리에서 다른 걸 해야지. 아마 저녁에만 문 열고 술을 팔면 돈을 더 잘 들어올 걸요.
가게 사겠다는 사람도 줄 섰어요. 그저 내가 직원들 쉴때 다 같이 쉬어버리면 가게 운영이 안되니까. ‘관둬야지’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또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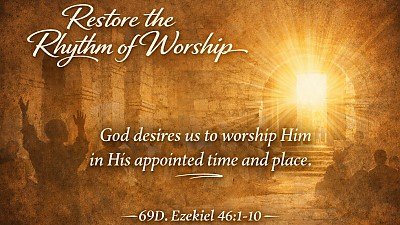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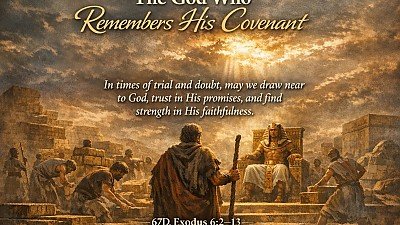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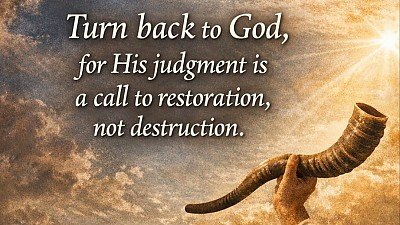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