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가을은 내게로 왔다

빗방울이 툭 툭 하고 떨어진다.
진하디 진한 분홍 꽃잎을 빗방울이 때릴 때마다 몹시 괴로운 듯 휘청거린다. 낮에는 얼굴이 상기되어 작은 나팔처럼 생긴 주둥이는 밤낮으로 벌렸다 오므렸다 한다. 툭 툭 떨어지는 빗방울에 늙은이 살 없는 뼈다귀처럼 앙상한 가지는 다시 휘청 고개를 숙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베란다 밑 화단에 띄엄띄엄 서 있는 분꽃이 홀로 화단의 주인으로 산지도 꽤 여러 날 되었다. 무성한 숲처럼 서 있던 봉숭아도 다 뽑아버리고 지난해 빈 화단으로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 지난여름 분꽃 모종 몇 개 얻어와 심은 것이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 눈길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눈 맞춤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수줍음'이란 꽃말을 가진 분꽃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 전까지 활짝 핀다. 씨앗은 까만 토끼 똥처럼 생겨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꼭 가루분을 담아 놓은 듯하다. 손바닥위에 놓고 크림 바르듯이 두 손을 슥슥 문질러 보면 정말 분을 바른 것처럼 손이 부옇게 된다.
그뿐 아니다. 대롱처럼 달린 꽃잎을 따다가 귀에 걸면 예쁜 귀고리가 되기도 한다. 하얀 고리, 노란 고리, 진달래색 고리를 귀에 꼽고 머리카락도 귀 뒤로 쓸어 넘긴다. 머리카락을 다 쓸어 넘긴 귓불 밑으로 꽃잎이 바람처럼 흔들린다. 흔들거림이 좋아서 머리를 살짝살짝 흔들고 신작로를 친구들과 함께 걸어 다녔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어제 저녁 조금 심란했다. 보지 못했더라면 잠자리를 밤새 뒤척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다. 그럴 것도 아니었지만, 내년에 다시 심으려고 꽃씨를 받으려고 화단에 갔었다. 새카만 씨앗이 붉은 꽃잎 사이로 간신이 매달려 있었다. 그걸 하나하나 똑똑 따서 편지 봉투에 담았다.
몇 포기 심지 않았는데 그동안 변화무쌍한 일기를 견디고 무성하게 가지를 뻗은 것이 대견스럽고 믿음직했다. 그런데 한 쪽 가지가 다른 가지보다 조금 잎사귀들이 힘이 빠져 축 쳐진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조금 힘이 없긴 했지만 꽃잎도 그렇고 언 듯 봐서는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가지 밑동이 찢어져서 조금 벌어져 있었다.
태풍이 왔을 때 가지가 찢어졌는지 찢어진 부분이 그리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아 들어 올려 보았더니 어찌하면 원상태로 다시 붙을 것도 같았다. 돌멩이를 몇 개를 주워 받쳐주었더니 그런대로 원래 모습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조금 틈이 생긴 곳이 마음에 걸려 바느질 할 때 썼던 실을 가지고 나와 옆에 있는 장미나무에 묶어 일으켜 세웠다. 뚝 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너무 세게 당겨서 찢어진 가지가 아예 부러졌나싶다.
장미 나무에 기대 선 분꽃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을 지도 몰라’하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한잠을 자고 난 새벽녘에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비가 온다는데 바람은 안 부려나’ ‘왜 그랬어? 그냥 두지’하는 이런 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에는 원망과 아쉬움으로 가득하여 어느새 화단에 가 분꽃을 마주하고 앉았다.
기상하면 제일 먼저 분꽃의 안부를 물을 것 같았는데 아침 준비며 등교하는 아이에게 우산을 챙겨주고 손 흔들어 보내고야 한숨을 돌렸다. ‘오늘은 커피 한 잔 하고 출근할까?’ 어둑한 바깥이 다시 비를 몰고 올 것 같았다. 하얀색의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커피 한 잔 탈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후두둑 후두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 맞아. 분꽃’ 찻잔을 갈색 원목 탁자 위에 올려놓고 베란다로 나갔다. 장미나무에 기대선 분꽃의 잎사귀는 이제 확연하게 축 늘어져있다. 큰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생명수 같은 비를 맞으며 싱그러움을 더하는 다른 가지들은 더 푸르고 잎사귀도 빳빳해 지는데 이제 대롱거리던 꽃잎도 말라가고 있는지 쭈글거렸다.
야속한 굵은 빗방울은 자꾸 툭 툭 하고 힘없는 꽃잎을 때린다. 달콤 쌉쌀한 커피를 다 마시고 허연 컵 바닥이 드러내고도 한참을 앉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진분홍의 눈물을 지켜봐야했다.
그렇게 가을은 내게로 왔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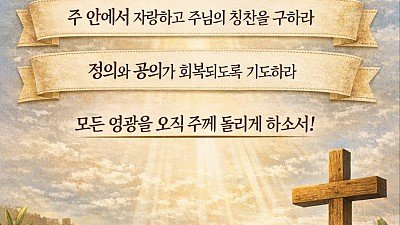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