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령 박사 생명과 죽음은 소중한 것.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유일한 소설 <말테의 수기>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됐다.
이어령 박사는 존재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헤친 이 책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신랄하게 풀어냈다.
파리를 배경으로 ‘존재의 내면’ 깊이 있게 고찰
이어령 박사는 지난 25일 오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에서 ‘소설로 찾는 영성 순례’ 두 번째 시간 ‘말테의 수기-생명찾기’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박사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테의 수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인간 내면의 삶에 주목하고,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경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풀어냈다.
1910년에 출간된 <말테의 수기>는 시인으로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7년간 파리의 가난한 생활 속에서 쓴 유일한 소설이다.
이 박사는 ‘정보와 이야기의 차이’가 이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9월 11일 툴리에 거리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책에 대해 노르웨이의 시인 옵스펠더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과 작자 릴케 자신의 체험을 투영한 것이라는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면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 감춰진 삶을 언어의 자기공명 장치로 찍은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어 그는 “천 년 이천 년 된 씨앗을 다시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나의 씨앗”이라며 “성경도 전부 이야기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영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 말테의 수기는 정보 속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만나보는 여행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파리의 도시에 대해 릴케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드는데 나는 오히려 죽으러 오는 것처럼 보인다”,
“좁은 거리의 곳곳에서 냄새가 났다. 요오드포롬 냄새, 감자튀김의 기름 냄새, 불안의 냄새였다”고 묘사한다.
파리 도시의 외형은 가장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상 환자들에게 바르는 약품인 요오드포롬과
하층민의 음식을 대표하는 감자튀김 냄새가 가득하다. 이는 곧 생명의 불안함, 존재가 결핍된 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메시지는 책에 등장하는 ‘임산부’의 이미지를 통해 보다 더 극대화된다.
릴케는 임산부를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열매를 잉태한 존재’로 표현하면서, 책의 서두를 시작으로 이야기의 곳곳에 등장시키고 있다.
생명의 기쁨과 죽음의 슬픔이라는 두 가지 열매가 임산부의 배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파리라는 도시도 들여다보면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생명과 죽음을 너무 하찮게 다뤄”
이 박사는 이와 같은 릴케의 역설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고찰했다.
그는 “생명과 죽음 모두 참으로 소중하고 당당한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냐”며 “100사람에게는 100사람의 죽음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날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은 똑같은 죽음으로 치부되고, 대단한 사건도 아니다. 오늘날 죽음은 통계 숫자와도 같다.
이처럼 죽음이 없는데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교회는 왜 있는가. 생명을 전달하고, 죽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며
“‘내 하프 소리는 비탄이 되었고, 내 피리 소리는 울음이 되었구나’(욥기 30장)라는 욥의 고백은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밑바닥에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말테의 수기>를 통해 생명과 죽음, 존재의 깊이와 소중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존재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사회는 생명과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다룬다. 존재 자체가 빈약해졌다”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화, 전설, 환상으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 자신을 투영시킨다.
그분 존재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령 박사는 존재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헤친 이 책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신랄하게 풀어냈다.
파리를 배경으로 ‘존재의 내면’ 깊이 있게 고찰
이어령 박사는 지난 25일 오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에서 ‘소설로 찾는 영성 순례’ 두 번째 시간 ‘말테의 수기-생명찾기’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박사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테의 수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인간 내면의 삶에 주목하고,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경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풀어냈다.
1910년에 출간된 <말테의 수기>는 시인으로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7년간 파리의 가난한 생활 속에서 쓴 유일한 소설이다.
이 박사는 ‘정보와 이야기의 차이’가 이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9월 11일 툴리에 거리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책에 대해 노르웨이의 시인 옵스펠더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과 작자 릴케 자신의 체험을 투영한 것이라는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면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 감춰진 삶을 언어의 자기공명 장치로 찍은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어 그는 “천 년 이천 년 된 씨앗을 다시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나의 씨앗”이라며 “성경도 전부 이야기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영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 말테의 수기는 정보 속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만나보는 여행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파리의 도시에 대해 릴케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드는데 나는 오히려 죽으러 오는 것처럼 보인다”,
“좁은 거리의 곳곳에서 냄새가 났다. 요오드포롬 냄새, 감자튀김의 기름 냄새, 불안의 냄새였다”고 묘사한다.
파리 도시의 외형은 가장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상 환자들에게 바르는 약품인 요오드포롬과
하층민의 음식을 대표하는 감자튀김 냄새가 가득하다. 이는 곧 생명의 불안함, 존재가 결핍된 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메시지는 책에 등장하는 ‘임산부’의 이미지를 통해 보다 더 극대화된다.
릴케는 임산부를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열매를 잉태한 존재’로 표현하면서, 책의 서두를 시작으로 이야기의 곳곳에 등장시키고 있다.
생명의 기쁨과 죽음의 슬픔이라는 두 가지 열매가 임산부의 배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파리라는 도시도 들여다보면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생명과 죽음을 너무 하찮게 다뤄”
이 박사는 이와 같은 릴케의 역설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고찰했다.
그는 “생명과 죽음 모두 참으로 소중하고 당당한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냐”며 “100사람에게는 100사람의 죽음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날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은 똑같은 죽음으로 치부되고, 대단한 사건도 아니다. 오늘날 죽음은 통계 숫자와도 같다.
이처럼 죽음이 없는데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교회는 왜 있는가. 생명을 전달하고, 죽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며
“‘내 하프 소리는 비탄이 되었고, 내 피리 소리는 울음이 되었구나’(욥기 30장)라는 욥의 고백은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밑바닥에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말테의 수기>를 통해 생명과 죽음, 존재의 깊이와 소중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존재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사회는 생명과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다룬다. 존재 자체가 빈약해졌다”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화, 전설, 환상으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 자신을 투영시킨다.
그분 존재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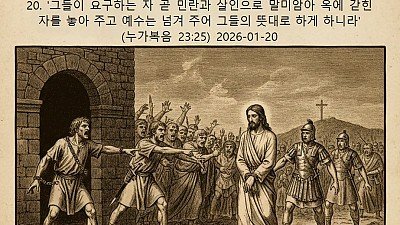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