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령. 인생 대담

양화진문화원(명예원장 이어령, 원장 박흥식)이 17일 오후 8시 서울 합정동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에서
‘장군의 수염’라는 주제로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의 두 번째 인생 대담을 진행했다.
지난 첫 번째 대담에서, 22살의 나이에 <우상의 파괴>라는 작품으로 등단했던 무렵을 중심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신과
인생관을 솔직하게 풀어냈던 이어령 박사는 이번 대담에서
자신의 인생과 문학 활동을 아우른 언어와 그 언어들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언어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했다.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의 언어,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언어,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의 언어가 그것. 모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박사는 “프로메테우스의 언어는 신과 인간을 갈라놓는, 자연의 질서와 기술의 질서를 갈라놓는 불의 언어, 반항의 언어이고,
헤르메스의 언어는 대립돼 있는 세계의 담을 뛰어넘고 모순의 강을 건너뛰는 다리의 언어”라며
“오르페우스의 언어는 상충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결합의 언어”라고 설명했다.
초창기 ‘불의 언어, 파괴의 언어, 반역의 언어’로 상징되는 프로메테우스의 언어들로 일관되던 그의 작품 세계는
4ㆍ19 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헤르메스의 언어로 전향하게 된다. 프로메테우스의 언어가 가진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혁명을 하고 진보하려면 프로메테우스의 언어가 필요하지만, 다이너마이트로 빙산 전체를 부술 수는 없듯
파괴의 언어로는 뭔가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빙산을 없애려면 기후가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헤르메스가 지팡이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듯 작품을 분석했다. 이른바 소통의 문학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언어는 모든 것의 화해와 융합을 지향하는 오르페우스의 언어로 바뀌었다.
최근 그가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이 박사는 “혁명의 언어만으로는 상처를 씻을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헤르메스가 되어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게 있더라”며
“오르페우스의 언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춤을 추며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
‘장군의 수염’라는 주제로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의 두 번째 인생 대담을 진행했다.
지난 첫 번째 대담에서, 22살의 나이에 <우상의 파괴>라는 작품으로 등단했던 무렵을 중심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신과
인생관을 솔직하게 풀어냈던 이어령 박사는 이번 대담에서
자신의 인생과 문학 활동을 아우른 언어와 그 언어들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언어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했다.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의 언어,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언어,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의 언어가 그것. 모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박사는 “프로메테우스의 언어는 신과 인간을 갈라놓는, 자연의 질서와 기술의 질서를 갈라놓는 불의 언어, 반항의 언어이고,
헤르메스의 언어는 대립돼 있는 세계의 담을 뛰어넘고 모순의 강을 건너뛰는 다리의 언어”라며
“오르페우스의 언어는 상충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결합의 언어”라고 설명했다.
초창기 ‘불의 언어, 파괴의 언어, 반역의 언어’로 상징되는 프로메테우스의 언어들로 일관되던 그의 작품 세계는
4ㆍ19 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헤르메스의 언어로 전향하게 된다. 프로메테우스의 언어가 가진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혁명을 하고 진보하려면 프로메테우스의 언어가 필요하지만, 다이너마이트로 빙산 전체를 부술 수는 없듯
파괴의 언어로는 뭔가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빙산을 없애려면 기후가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헤르메스가 지팡이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듯 작품을 분석했다. 이른바 소통의 문학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언어는 모든 것의 화해와 융합을 지향하는 오르페우스의 언어로 바뀌었다.
최근 그가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이 박사는 “혁명의 언어만으로는 상처를 씻을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헤르메스가 되어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게 있더라”며
“오르페우스의 언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춤을 추며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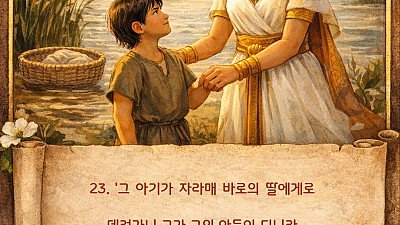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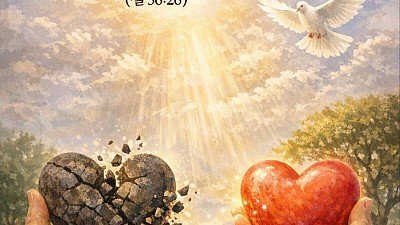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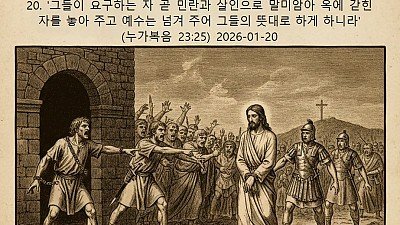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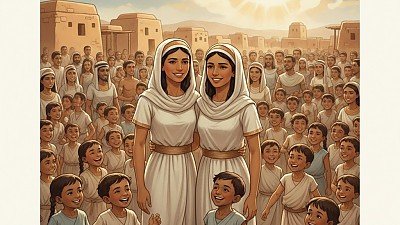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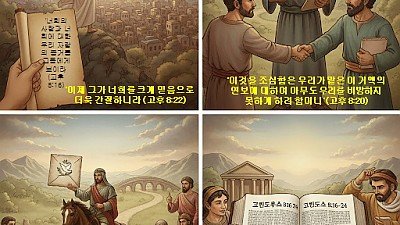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